Republic of South Africa
대자연을 품은 도시, 케이프타운
▲ 케이프타운 공항을 나서자마자 보이는 풍경
남아공의 마더시티(Mother City)라 불리는 케이프타운.
공항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자 눈 앞에 보이는 것은, 케이프타운의 상징인 '테이블 마운틴'이었다. 정상이 평지로 되어있어 마치 식탁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하여, '테이블'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이처럼 케이프타운은 뒤에는 산을, 앞에는 대서양과 인도양을 품은 대자연의 도시다.
▲ 테이블마운틴에서 바라보는 케이프타운 전경
케이프타운의 진가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들러야 하는 코스 역시, 바로 이 테이블 마운틴이다. 해발 1,086m의 높이인 테이블마운틴은 산 정상이 3km가 넘는 평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 케이프타운을 360도로 조망할 수 있어서 싱그러운 도시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최적의 스팟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케이프타운에서 가장 감탄했던 것은 이처럼 도시를 둘러싼 윤택한 자연환경이었다. 일행 중 한명은 '호주가 떠오르지만 호주보다 더 와일드하다.'는 감상을 들려주시기도.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 하늘에 뭔가가 떠다니길래 유심히 봤더니, 글쎄 도심에서 패러세일링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 때의 그 충격이란...
▲ 케이프타운의 야경명소, 시그널 힐
찬란한 오렌지빛 석양이 인상적이던 시그널 힐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투를 품었을 만큼, 케이프타운은 매력적인 도시였다. 아프리카 특유의 티 없이 맑고 가벼운 공기와 선선한 바람, 압도적으로 풍만한 하늘과 도시의 조화! '모든 것을 갖춘 파라다이스'란 이런 풍경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정도였다.
▲ 케이프타운 워터프론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회의 소재지로서 입법수도의 지위를 갖고 있는 '케이프타운'은 1652년 네덜란드인 얀 판 리비크(Jan Van Riebeek)에 의해 세워져 남아공의 시초가 되었다고 한다. 즉, 케이프타운은 남아공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자 '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
도시를 세운 사람들이 네덜란드인을 비롯한 유럽인이었기 때문에 도시경관 및 건축물은 유럽풍. 의료, 교육, 교통과 같은 사회 인프라 역시, 그들 수준으로 도입되어 최고를 자랑한다. '아프리카'하면 문명의 손이 닿지 않은 미개발지역처럼 느껴지지만 남아공 만큼은 예외인 셈. 과거 백인 통치시절에는 극단적인 인종차별정책(아파르트헤이트)으로 약 10%의 백인이 90%의 흑인을 지배하며 국제적 비난을 받았으나, 1950년대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에 의해 점차 사회적 각성이 시작되어, 1994년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만델라가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평등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평등이 시작된지 불과 20여 년.
제도 속에서는 인종차별이 사라졌을지 모르나 현실적으로는 아직 과도기에 놓여있는 남아공. 백인의 인식도, 비(非)백인의 평등에 대한 인식도 자리잡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남아공의 현재. 여전히 부의 비정상적인 분배, 보이지 않는 불평등을 비롯하여 고쳐야 할 수많은 악폐습이 남아있다. 우리가 보통 '남아공의 치안'을 우려하는 것은, 이 악폐습에서 비롯된 사회의 그림자를 우려하는 것이다.
남아공 여행은 여전히 일반적으로 '위험하다'는 인식이 태반이고, 실제로도 '안전하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가이드와 차량이 대동하는 팩키지 여행이라면 모를까 자유여행이라면 반드시 주의해야한다. 특히 동양인은 더더욱 그러하다.
나는 빛도 들지 않는 거리의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마약에 취해 죽어가는 흑인을 보았다. 전기가 부족하다보니 위험천만하게도 전선을 주렁주렁 꼬아 거미줄처럼 엮어놓은 깡통촌도 보았다.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와 노숙자, 여행자의 주머니를 노리는 소매치기도 물론 보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케이프타운을 대변하는 풍경은 아니다.
▲ 유색인 거주구역 보캅(Bokaap) : 해방을 기뻐하며 건물 외벽을 색칠했다고 한다
남아공 여행은 내 인생 최고로 손꼽히는 경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안에 대해서는 사실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그것은 남아공이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치안이 결국 그들 사회의 병폐와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에 고작 6박9일을 여행한 내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내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내 어설픈 '아는 척'이 그들에겐 상처가 될 수도, 또 누군가에겐 편견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단 하나 분명한 것은, 남아공의 치안 문제는 모두 '빈곤'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이다. 길고 긴 차별을 겪어 온 유색인들이 제대로 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평등과 자유를 맞이하니 생존을 위해 자연스레 범죄로 발을 드밀 수 밖에 없는 것. 따라서 인구비율이 가장 높으며 슬럼가가 거대하게 형성되어있는 남아공 최대의 도시 '요하네스버그'는 자연스레 범죄율이 높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백인 거주율이 높은 (35%) 케이프타운은 상대적으로 남아공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되었다고.
▲ 케이프타운의 금빛 야경
그러나 내가 케이프타운에서 본 것은 결코 음울한 좌절의 기색이 아닌, 여유롭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희망이었다. 나는 그들이 해방을 기뻐하며 알록달록 색칠한 건물 외벽에서, 이방인에게 다정하게 웃으며 흔쾌히 사진 찍길 허락하는 친절함에서, '빅 이슈'를 팔며 운전자와 농담을 나누는 노숙자의 모습에서 남아공의 희망을 보았다.
분명 남아공은 아직 여행하기엔 조심스러운 지역이고, 여행을 떠나더라도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지역이지만,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화합하는 '무지개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들의 꿈을, 그 희망의 문턱을, 그 과도기를 열렬히 응원하고 싶다.

여행하고 글 쓰는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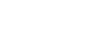























_왕가의계곡_valley_of_kings_(2)_21829933_79519590-300x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