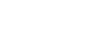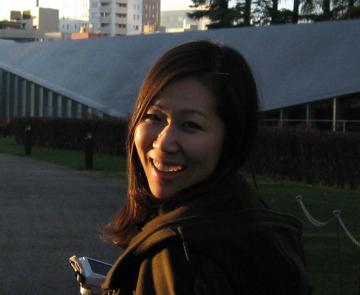시리아를 여행하던 중이었다.
'하마'라는 도시에 도착했고
나는 으레 그랬듯 근처의 싸구려 숙소를 잡았으며,
여독을 푼다는 핑계삼아 하루종일 퍼질러 잤다.
하지만 여행 중에 하루를 허비하는게 그리 쉬운 일일리 없다.
문득 어딘가로 떠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론리플래닛을 펼쳐 들게 되는 것,
그것이 여행자의 습성이니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한 지명.
께사르 빈 와덴
께사르 빈 와덴에 대한 설명은 단 세줄이었다.
"비잔틴 제국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
아름답다. 그리고 가기 위해서는 택시를 타야 하는데,
그것 마저도 쉽지 않다"고.
나는 여행자의 본능을 믿어보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배낭 하나 둘러매고 목적지로 향했다.
시리아는 숫자도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기에
께사르 빈 와덴를 향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젊은데다 여행자인데 못할게 무언가. 객기는 이럴 때 써야 하는 놈이다.
1970년대산 후즐근한 로컬버스는 다리로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좁았다.
시리아 사람들이야 일상이니 그저 편안해 보였지만,
나는 짜증나는 마음에 '이런 차가 다 있느냐'고 불평을 좀 했다.
그랬더니 한 남자가 '메이딘 코리아'라고 대답했다.
자세히 보니 'hyundai'라고 분명히 박혀 있다. 쩝. 할 말이 없다.
불편함을 잊어 보려고 이어폰을 끼고 낯선 풍경을 관람하던 찰나,
기사가 다 왔다며 내리라고 한다.
하지만 내린 곳은 '께사르 빈와덴'이 아닌 엉뚱한 곳.
꼬질꼬질 구겨진 지도 위의 아라비아 글자를 본
시리아 사람들이 내가 길을 잘못 찾아왔다고 말한다.
그렇게 두 번이나 버스를 갈아타고도 이름모를 곳을 헤매이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까사르 빈 와덴'을 어떻게 가느냐고 묻자,
그는 친절하게도 다른 행인들을 불러 회의를 한다.
심지어 지나가는 차를 잡아세워 근처까지 데려다 주라고 말하는 것 같다.
본격적인 '까사르 빈와덴'의 여행은 여기부터,
히치하이킹으로 시작하게 된다.
나보다 나이를 더 먹었을 오래된 자동차는
끝없이 펼쳐진 사막의 모래를 가르며 달린다.
하늘도 맑고, 바람도 시원하다.
주위에서 들리는 바람소리와 알아듣지 못하는 아라비아어는
여행자의 기분을 드높여준다.
창가 너머 스치는 사람들은 내게 환한 미소를 건넨다.
기분이 좋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 이게 바로 여행이었지.
갑자기 차가 멈추고,
차 주인은 이 곳이 께사르 빈와덴이라 말하는 것 같다.
엄지손가락을 내밀며 '굿 럭!'이라고, 히치하이킹을 통틀어
내가 알아들을 한 마디를 남기고 멀어져갔다.
도로위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다.
황폐한 사막과, 높은 하늘 위로 날아다니는 새들,
그리고 세차게 부는 바람만이 나와 함께 할 뿐이다.
차츰 어떤 건물이 커다란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사막위에 덩그란히 놓여있는 비잔틴제국의 유적은 환상 그 자체였다.
거대한 유적을 발견할때 고고학자는 분명
이런 쾌감을 느꼈을 것이라 상상하며,
또 다시 걸음을 재촉한다.
유적을 지키는 할베는 나에게 "일주일 만에 온 외국인" 이라고 한다.
그만큼 이 곳은 여행자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여행사들이 추천하는 곳도 아니어서,
방문자 수는 극도로 적다.
께사르 빈 와덴의 매력을 몰라서 일까?
난 여행을 시작한 이래,
가장 멋진 곳이 께사르 빈와덴이라고 생각했다.
께사르 빈 와덴은 6세기 경에 비잔틴제국 때 세워진 곳으로
페르시아를 방어하기 위해 생긴 요새다.
건물 내부는 이미 많이 손상되었지만,
그리스 문양으로 세겨진 돌맹이들의 흔적은
시리아의 대표적 유적지인 팔미라와 비교해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답다.
무엇보다 이 곳 여행의 묘미는 북적이는 관광객들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고독의 여행이란 점이다.
나는 여행을 하며,
가장 바람이 아름다웠던 곳으로 이 곳을 꼽는다.
지구의 어느 낯선 곳 위에 서있다는 기분,
그리고 여행의 자유로움을 진정 느낄 수 있는
내 자신이 바람같고, 먼지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웅장한 유적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해맑음을 보며
사라진 역사와 현재에 대한 아이러니함을 느꼈다.
낯선 곳으로의 여정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며,
그 곳으로 떠나는 길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그리고 그 곳에 도착하여 느끼는 희열은 결국 승리다.
문득 로마의 장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말이 떠오른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veni, vidi, vici)"

대학원에서 'fine art-photography'를 전공했고, 내셔널지오그래픽 국제사진 공모전 우수상,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대상 등 20여회가 넘는 수상 경력이 있다. EBS 다큐멘터리 ‘커피로드’ 제작진으로 참여, 포토에세이 ‘히말라야의 선물'을 재능기부 형식으로 출간하기도 했다. http://blog.naver.com/dreamciel